
4, 둘째 아들이 기겁했다.
글/썬라이즈
‘언제 긴 옷을 입었지...?’
의문을 갖는 것 자체도 큰아들은 좋은 일이라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 진정 저 아들이 큰아들 아범이냐고 묻는 다면 나는 ‘몰라’이다. 그렇더라도 한갓 옷 입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춤추며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내가 끔찍이 여겼던 큰아들이니까 그럴 것이란 생각은 든다. 그것도 잠깐 동안이지만...
이젠 생각하는 것도 귀찮다.
귀찮은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다.
그러니 뭔 얘길 써야 하는지 쓸 얘기도 없다.
그래도 이렇게 씨부렁거리는 것은 나를 부모라고 찾아와 수발을 드는 큰아들인 아범이 고마워서이다. 그런데 듣기로는 ‘아범아!’라고 큰아들을 불러본 적이 없단다. 왜 아범아라고 부르지 않았는지, 아니 부른 것 같다. 그런데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예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단다.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들아, 아범아, 큰애야 등등 부를 호칭은 많다. 그럼에도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쨌거나 나에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인 것이다.
특히 누가 뭐라고 말하면 눈치 백 단쯤 되는지 묻는 말을 잘도 받아넘긴다. 정말로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자식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다. 이쯤 되니 누구든 나에게 말을 걸면 ‘그래요. 알지, 그럼요, 늙으니까 자꾸 깜박깜박해,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야 알지, 그럼, 애들은 잘 크지,’ 이렇듯 말도 잘 받아넘긴다. 그러니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상대는 자신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자식들은 내 기분을 생각해 ‘그래요. 맞아요.’ 받아 주는 것일 테지만 나는 말한 것들이 진실인 것이다. 정작 자신이 뭔 말을 실수했는지 그런 것은 중요치가 않은 것이다. 그냥 얘기한 것을 진실로 믿으니까,
사실이지 나는 증손자들을 여럿 봤다. 그런데 애들은 잘 크냐고 물었다는 것은 딸이든 아들이든 손자들이 어리다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인 내 얘기일 것이다. 그러니 얘기를 하다가도 자식들은 손자들이 커서 결혼도 했고 증손자들을 낳았다고 부언 설명을 한다. 그렇다고 그 얘기를 귀담아듣는 것이 아니다. 건성으로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뭣하면 오히려 추궁하듯 짜증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진즉에 알려줬어야지 알지...’
내 대답에 상대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웃어 보인다.
이빨이 없으니 정말로 바보 같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딸들은 웃는 모습이 귀엽단다.
그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분도 좋다.
우리 집엔 실내 화장실과 실외 화장실이 있다.
나는 화장실이 둘인지 알지 못한다.
그냥 그때그때 가는 곳이 화장실이구나 하는 것뿐이다.
“엄마! 어디 가세요?”
“......”
“바람만 쐬고 빨리 들어오세요.”
현관을 나서는 나에게 옆방에 사는 젊은이가 말했다. 나이가 50이 훌쩍 넘은 둘째 아들이지만 내 눈엔 그냥 옆방에 사는 젊은이다. 그런데 오늘은 둘째 아들만 집에 있는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알았다.’ 대답하곤 밖으로 나왔다. 어쨌든 나는 ‘예,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등등 정말이지 대답 하나는 시원시원 잘한다. 둘째 아들은 나와 보지도 않고 빨리 들어오라고 말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일이라 둘째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실외 화장실은 재래식이다.
화장실 문턱이 높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애를 먹는다. 그럼에도 나는 애를 먹었던 기억은 잊고 실외 화장실을 자주 사용한다. 오늘도 나는 실외 화장실을 사용했다. 늙어서 그렇겠지만 변을 보는 것도 힘들다. 변비에 걸렸다가 툭하면 설사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내 신체 조화다. 그러니 변비가 있는 날은 화장실에 앉아서 보통 10분 20분, 그 이상 끙끙거린다. 아랫배에 힘을 준다고 주지만 정작은 힘도 들어가지 않는다. 내 느낌은 주는 것이지만...
아마도 한 20분은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변은 보지 못했다.
느낌이 변을 본 것 같으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한참을 끙끙거린 후에야 일어설 수가 있었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제정신이 든 것처럼 씨부렁거렸지만 일어선 후엔 뭔 말을 했는지 잊어버렸다.
그랬으니 언제 힘들었냐는 듯 나는 화장실을 나섰다.
“어이쿠! 으음...”
마음은 젊으니 조심성 없이 화장실 문턱을 넘다가 넘어지고 만 것이다.
그래도 창피한 것은 아는지 누가 볼까 봐 큰 소리도 못 쳤다.
빨리 일어서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질 않았다.
간신히 일어나 앉아선 멍하니 그렇게 앉아있었다.
둘째 아들 말로는 1시간쯤 그렇게 앉아있었단다.
어쨌든 간에 둘째는 내가 들어오지 않자 찾으러 나왔다가 나를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한다.
사실 소리를 쳤다면 누구든 와서 도와줬을 텐데 그러질 않은 것이다. 다행히 둘째가 나와 봤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겨울 같았으면 벌써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둘째가 얼마나 놀랐던지 119를 부르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난리를 쳤단다.
그때부터 자식들은 밖에 화장실은 절대로 사용을 못하게 했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에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대로 느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어도 내가 밖에 나갔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 다행이라면 내가 멀리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런저런 행동들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사고를 친 것이 되었다.
---계속
자연사랑/어린이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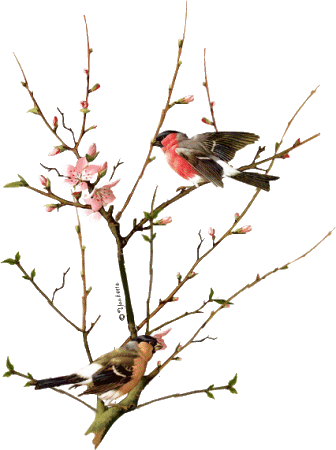

날이 무덥습니다.
눈으로 더위 식히세요.
